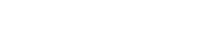사법인[四法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죽림사 작성일2005.11.25 조회7,917회 댓글0건본문
삼법인(三法印)[사법인(四法印)]; 제행무상인(諸行無常印), 제법무아인(諸法無我印), [일체개고인(一切皆苦印)], 열반적정인(涅槃寂靜印)
부처님의 깨달음 가운데서 가장 근본적이며 당시의 다른 사상과 비교해 특별히 두드러진 사상이 이른바 三法印說이었다. 여기서 法印이란 '법의 표식' '불법의 특징' 등을 일컫는데, 중국에서는 어느 경전이든 법인사상에 합치되지 않으면 이를 바른 불법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삼법인은 불교의 특징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어, 불교를 다른 종교나 사상과 구별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불교의 깃발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印'이라고 한 이유는 법인으로 사실이 진리로서 허망하지 않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삼법인은 제행무상(諸行無常), 제법무아(諸法無我), 일체개고(一切皆苦)의 형식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무상과 무아의 개념 속에 고(苦)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체개고 대신에 열반적정(涅槃寂靜)을 넣어서 제행무상, 제법무아, 열반적정의 형식을 더 많이 사용하고 여기에 일체개고가 포함되면 사법인이라고 한다.
제행무상인(諸行無常印)
제행(諸行); 일체의 만들어진 것, 다시 말하면 물질적 정신적인 모든 현상.
무상(無常); anita 를 번역한 말로써 항상함이 없다. 변화하고 변천한다는 말.
따라서 제행무상이란 모든 존재는 항상함이 없이 변화하는 것이다라는 의미.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한 순간도 멈추지 않고 바뀌고 변하며,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인간이 생로병사(生老病死)를 거치지 않을 수 없듯이 이 우주 세계의 모든 존재도 한결같이 나고 머물고 변하고 사라지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된다. 산이나 바위 같은 것도 외견상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우리가 지각하지 못하는 것일 뿐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다. 존재란 여러 요소들이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 모여있는 집합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존재를 구성하는 요소와 조건들이 변하거나 사라진다. 자연과 인간의 바탕을 이루는 물질적 요소는 원자가 소립자로 구성되어 있고, 이 소립자 또한 불변의 존재가 아니라고 현대과학이 실증하고 있다. 그리고 정신적 요소라 할 수 있는 영혼 역시 오온이 무상함으로써 항구불변 하지 못하는 것이다.즉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고정불변적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니, 모든 존재는 무상한 것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불교의 무상설은 중생들의 무상함을 유상함으로 보고 집착하는 무지를 깨우치기 위함이다. 올바른 인생관을 수립코자 한다면 먼저 현실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직시해야 하는 것이다. 제행무상은 이러한 목적을 가진 것이다.
제법무아인(諸法無我印)
제법(諸法); 모든 존재를 의미.
무아(無我); 아(我)가 없다라는 의미.
모든 존재에는 고정불변하는 실체적인 아가 없다라는 의미. 모든 존재는 비실체적인 여러 가지 요소<오온(五蘊)>로 이루어져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 고정불변한 실체적인 아가 없다.
무아(無我)이론의 특징은 모든 것에는 고정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고정성이 없는 것을 무자성(無自性)이라고도 한다. 자성(自性)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독립된 형이상적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다. 고정불변한 형이상학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근본불교의 기본적 이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무아임을 꿰뚫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보통 '나'라고 할 때 그 나는 육근(六根)을 말하는 것이 보통이다. 인간이 나라고 할 때는 상일성(常一性)과 주재성(主宰性)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육근.오온은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다. 무상함은 상일성이 없기 때문이고, 괴로움은 주재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들을 결코 나의 실체라고는 못하는 것이다. 불교의 무아관은 나의 절대적인 부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다운 나를 찾기 위한 기초작업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아닌 것을 나로 착각하고 있다면 참다운 나는 그러한 착각의 부정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온(蘊, khandha); ‘모임’을 의미.
오온; 다섯 개의 요소가 모인 것이라는 뜻. 색(色, rupa)은 물질로서의 육체를 가리킨다. 육체는 4가지 기본요소인 사대(四大)와 사대에서 파생된 물질인 사대소조색(四大所造色)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대란 지, 수, 화, 풍으로 지(地)는 뼈, 손톱, 머리카락 등 육체의 딱딱한 부분이고, 수(水)는 침, 혈액, 오줌 등 액체부분이다. 화(火)는 체온이고, 풍(風)은 몸속의 기체를 가리킨다. 사대소조색이란 사대로 이루어진 다섯 가지의 감각기관인 눈, 코, 귀, 혀, 몸 등이다. 수(受, vedana)는 괴로움과 슬픔 등의 감수작용이다. 수는 내적인 감각기관과 그것에 상응하는 외적인 대상들과의 만남에서 생긴다. 수에는 성질상 세 가지가 있다. 즉 고수(苦受), 낙수(樂受), 불고불락수(不苦不樂受)이다. 고수란 즐거운 감정이고, 낙수란 괴로운 감정이고, 불고불락수란 사수(捨受)라고도 하는 것으로서 괴로움도 즐거움도 아닌 감정을 가리킨다. 상(想, sanna)은 개념표상의 취상작용(取象作用) 또는 심상(心象)이다. 상 역시 감각기관들과 그것에 해당되는 대상들과의 만남에서 생긴다. 상은 대상들을 식별하고 그 대상들에게 이름을 부여한다. 행(行, sankhara)은 의지작용 및 그 밖의 정신작용이다. 인간이 동물과 달리 윤리생활을 할 수 있고 업을 짓게 되는 것은 이 행의 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넓은 의미로서의 행은 수, 상, 식을 제외한 모든 정신작용과 현상이다. 식(識, vinnana)이라는 것은 인식 판단의 의식작용을 의미한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식의 영역은 대상을 인식하는 데까지 가지 않는다. 그 전 단계인 주의 작용일 뿐이다.
오온의 이론은 인간 존재란 색, 수, 상, 행, 식 등 다섯 가지 요소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잡아함경에서는 이것을 “마치 여러 가지 재목을 한 데 모아 세상에서 수레라 일컫는 것처럼 모든 온이 모인 것을 거짓으로 존재라고 부른다”라고 비유로써 설명하고 있다. 수레는 바퀴, 차체, 축 등 여러 요소가 모였을 때 비로소 존재할 수 있는 것일 뿐 이 요소들과 관계없이 홀로 존재할 수는 없다. 인간 존재도 마찬가지로 색 수 상 행 식 등 다섯 가지 요소가 모일 때 비로소 인간이라는 존재도 성립할 수 있게 된다. 오온 이론에 의하면 이 다섯 가지 요소를 제외한 영혼과 같은 것을 인정할 수 없다. 수, 상, 행, 식과 같은 정신현상은 영혼과 같은 존재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감각기관과 그 기관에 관계되는 대상과의 만남에서 생기게 되는 것이다. 즉 여섯 가지 감각기관[六根]과 그것에 관계하는 여섯 가지 대상[六境]이 합칠 때 여섯 가지 식[六識]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오온 이론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 존재란 5개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이 각 요소들은 모두 비실체적인 것이므로 이와 같은 요소들로 이루어진 인간 존재 역시 비실체적이라는 것이다. 거기에는 고정불변적이거나 초월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열반적정인(涅槃寂靜印)
열반(nirvana); ‘불어서 끄다’혹은 '불어서 꺼져있는 상태'를 의미. 탐욕, 분노, 어리석음 등 번뇌의 불을 끈 상태.
초기경전에서는 열반을 “탐욕의 사라짐, 분노의 사라짐, 어리석음의 사라짐, 이것을 이름하여 열반이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寂靜; 마음에 번뇌가 없고 몸에 괴로움이 없는 편안한 모양.
그러므로 열반적정은 모든 번뇌를 없애 몸과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가 된다는 의미.
제행무상과 제법무아는 現象界에 관한 불교의 철학적인 진리관인데 비해 涅槃寂靜은 불교의 종교적인 실천이성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체현될 이상세계.
초기경전에 의하면 당시의 열반설에서는 색계정(色界定)이나 무색계정(無色界定) 등의 여러 가지 선정의 상태를 이상적인 열반이라고 간주하거나 또는 다섯 가지 감각기관의 욕락에 빠지는 세속적인 쾌락이 열반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던 듯하다. 석존이 수행시절에 가르침을 받은 두 선인(仙人)은 무소유처정(無所有處定), 비상비비상처정(非想非非想處定)이라고 하는 뛰어난 무색계정이 열반의 이상이라고 하였는데 석존은 곧바로 그들과 동일한 선정에 들어갈 수 있었어도 여전히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뛰어난 무색계정도 실제로는 이상적인 열반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여기고 이 두 스승으로부터 떠났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6년간의 고행후에 열반은 신체를 혹사하여 고통스럽게 하는 고행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체험하였기 대문에 이 고행도 포기하였다. 그리고 고행이나 욕락과 같이 극단으로 치닫는 것이 아닌 중용적인 생활과 심신상태 아래에서 세계 인생의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비로소 열반의 경지에 도달하여 불타가 되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 열반은 단순한 고행이나 선정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세계와 인생의 진리에 관한 올바른 지혜를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경전에서 열반이란 말을 멸(滅), 적(寂), 불사(不死), 최상의 안락 등 여러 가지로 번역하고 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최상의 행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열반은 불교에서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이자 최고의 이상이다.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결국 이 열반을 얻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열반적정인은 불교의 이상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일체개고인(一切皆苦印)
일체가 영원히 머물러주지 않는 곳에, 즉 무상한 곳에 불안과 서글픔이 있는 것이다. 인간의 느낌에는 괴로움(苦)과 즐거움(樂) 그리고 버림(捨, 不苦不樂)의 세 가지가 있다. 삼법인설의 괴로움은 괴로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과 즐거움도 괴로움도 아닌 것까지 괴로움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상하기 때문이다. 이런 견지에서 부처님께서는 '무상한 것은 고(苦)다.' 라고 단정하신다. 그래서 생로병사, 미워하는 사람과의 만남,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 구하는 바를 얻지 못함, 오취온(五取蘊)이 치성함 등이 모두 괴로움이라고 하셨다.
삼법인 중에는 일체개고의 항목을 빼고, 열반적정(涅槃寂靜)이라는 항목을 넣어 삼법인으로 할 때도 있으며 또는 여기에 일체개고의 항목을 다시 합하여 사법인(四法印)이라 할 때도 있다.
無常이고 無我인 존재를 놓고 有常이요 有我이길 바라는 중생의 헛된 욕망의 불만족으로 인하여 무상이고 무아인 것에 괴로움을 느끼게 된다.
일체개고는 十二因緣說로 보면 順觀에 해당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